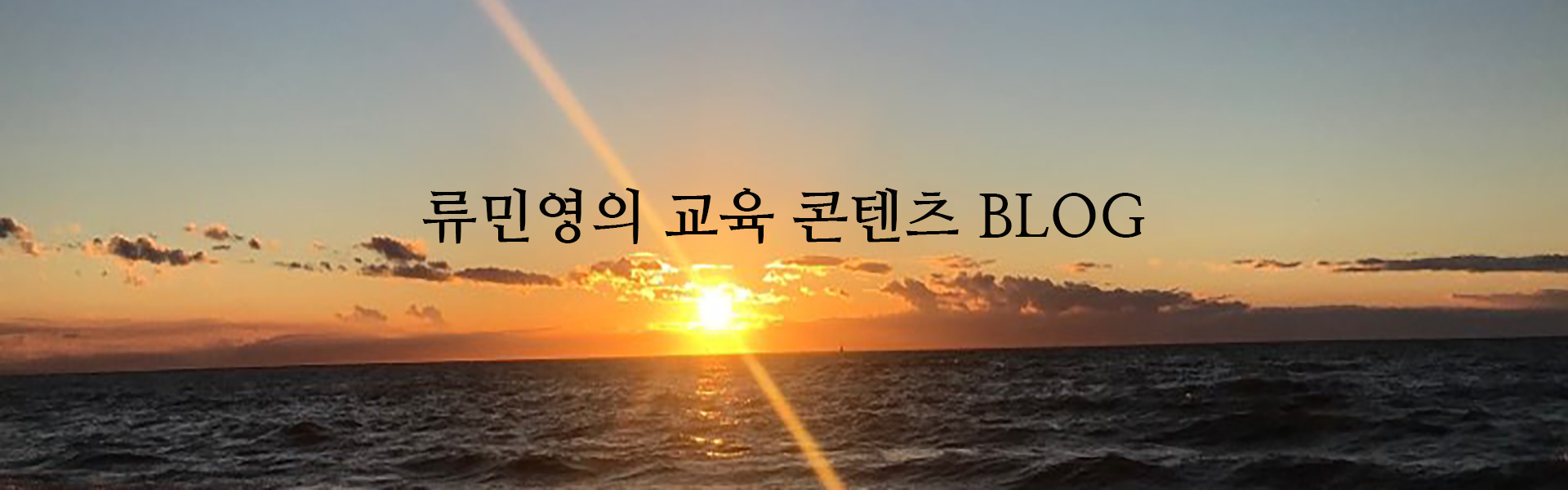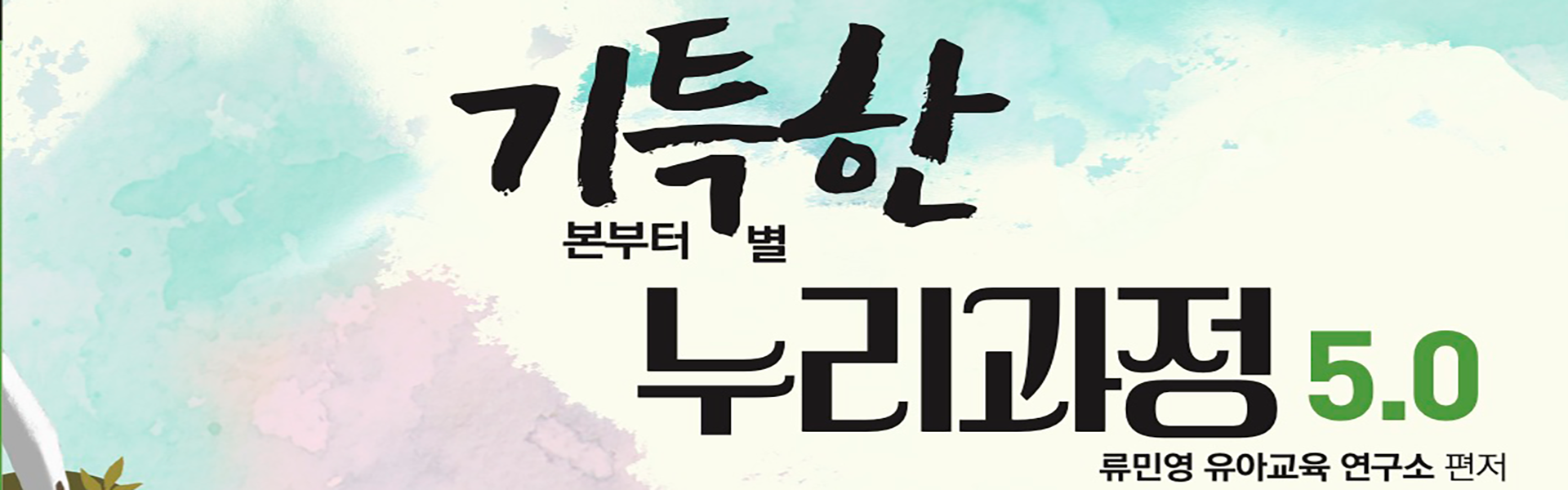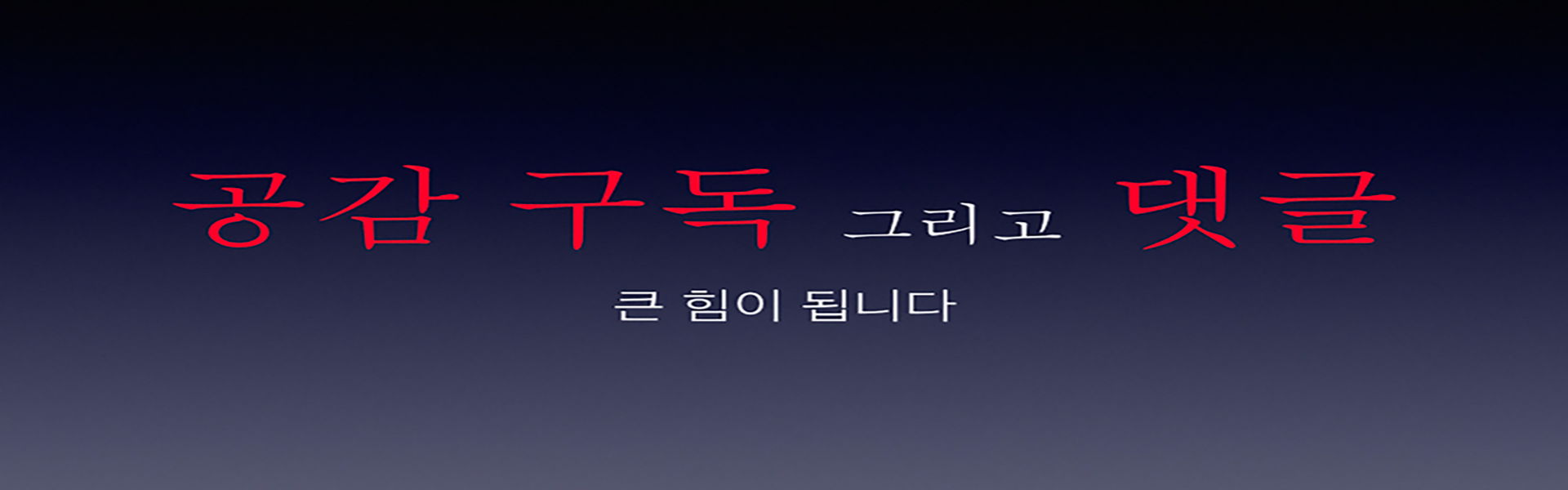1.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의 한 고전.
2. 맹자의 사적에 대해서는 양혜왕(梁惠王)과의 회견기사가 실린 《맹자》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전국시대의 제후(諸侯)들에게 객(客)으로서 공자의 인의(仁義)의 이상을 내걸고 역설하며 다닌 점을 꼽을 수 있다.
3. 《맹자》를 엄밀하게 맹자의 자저(自著)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미 일관한 논조(論調)와 설득력 있는 문장의 박력이 자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류(魚類)나 문집(文集)에 보이는 주자(朱子)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4. 《맹자》7편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지(漢志)에는 제자(諸子)중 유가(儒家)에 편입되었고, 수지(隨志) 및 구당서 경적지(舊唐書經籍志)도 한지에 기술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다만 조기(躁氣)의 주해가 붙게 된 뒤로부터 《맹자》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졌고 당의 한퇴지(韓退之)에 이르러 비로소 《맹자》의 귀중한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공자의 도가 얼마나 존귀(尊貴)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5. 이에 정자(程子)는 논어(論語)․대학(大學)․중용(中庸)과 함께 《맹자》를 사서(四書)라고 칭했으며 주자는 특히 경서(經書)로 존봉(尊奉)하게 되었으며 맹자를 공자의 다음인 아성(亞聖)이라고 칭하여 병렬(竝列)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