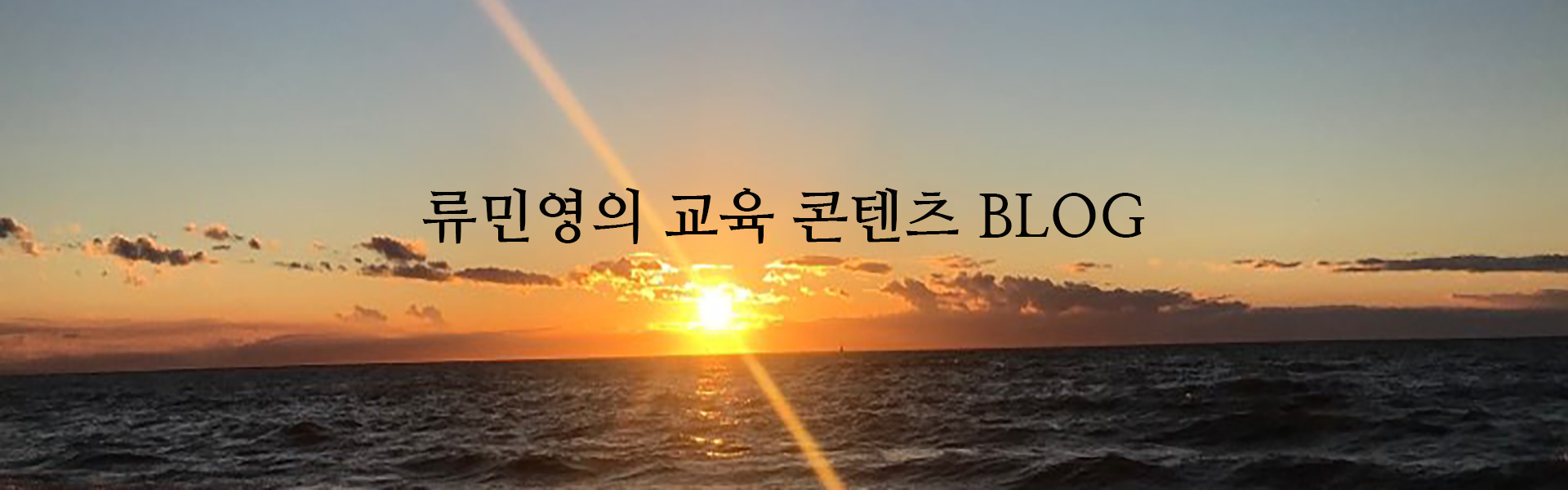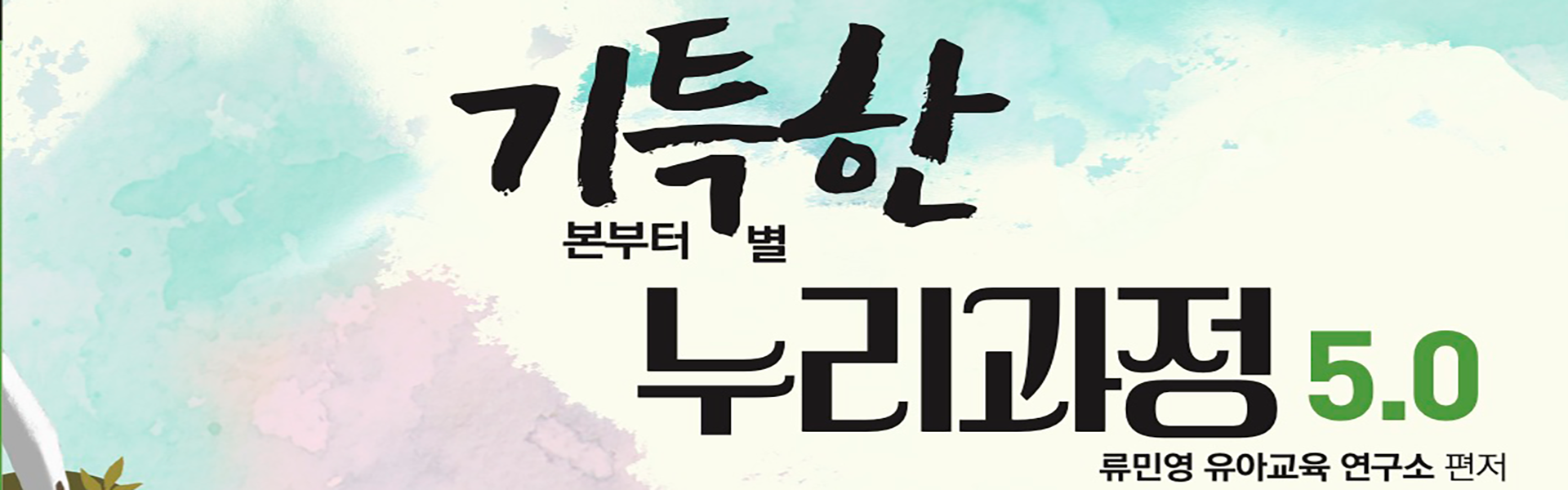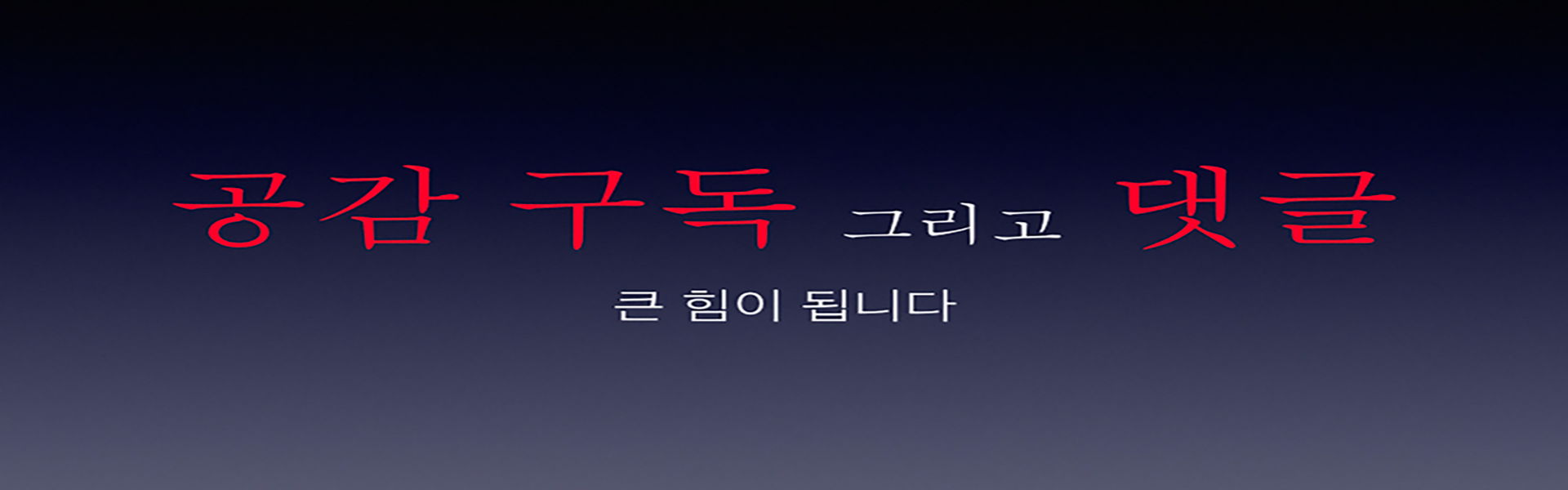1. 명나라의 유학자 왕수인(王守仁, 호는 陽明)에 의해 주창된 유학의 한 계통.
2. 양명학의 사상적 배경은 송(宋)의 육상산(陸象山)과 명(明)의 진백사(陣白沙)등에 의해 계승된 심학(心學)에 있다.
3. 흔히 육왕학(陸王學)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설에 대항하여 심즉리(心卽理)설을 학문의 요체로 삼고 있다.
4. 왕양명의 주자학에 대한 비판의 첫 단서는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설에 있다.
5. 왕양명에 따르면, 주자의 격물치지란 모든 사물 즉 사사물물(事事物物)위에 나아가 이른바 정리(定理)를 구하는 것이다.
6. 주자의 성즉리 설에 의하면, 이(理)는 인식 주체의 내적인 이인 동시에 객체인 여러 사물에 동시에 내재하는 이이기도 하다.
7. 참다운 앎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의 이와 인식 개체로서의 사물의 이가 서로 만나 조응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앎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 주체가 갖고 있는 이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외부 사물의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8. 그러나 왕양명은 주자의 이러한 격물설은 주체와 객체, 심과 물, 내와 외를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대립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또한 주자는 격물설을 해석하여 천하의 모든 사물을 하나씩 궁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하였으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진실되게」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9. 그는 이러한 의문을 통하여 격물치지의 의미는 심즉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주자와 같이 마음의 이와 사물의 이가 서로 응(應)하는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마음이 곧 이라 하여 상즉(相卽)하는 관계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지와 행의 관계는 주자류의 선지후행(先知後行)적인 해석을 배격하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10. 왕양명에 의하면 인간이 앎을 이룬다는 것(致知)은 결코 외연적인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자리하는 도덕적인 자각능력을 갖춘 「양지」(良知)를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에있다.
11.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 남언경(南彦經)과 이요(李搖)등에 의해서이고, 주자학 일변도의 사상계에 비교적 깊이 있게 양명학이 수용된 것은 하곡(霞谷) 정제두(鄭薺斗)에 의해서이다. 그의 학문은 양명학이 지닌 인간과 사물의 일원론적인 이해 태도와 양지론(良知論)에 깊이 경도되어 있고, 주자학처럼 객관적인 사물에서 이치를 찾는 이른바 즉물궁리(卽物窮理)를 반대하고 마음속에서 삶의 이(生理)를 찾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12. 그의 학설은 그 후 이광사(李匡師), 이광려(李匡呂), 이건창(李建昌)등의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를 탄생시켰다. → 육왕학(陸王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