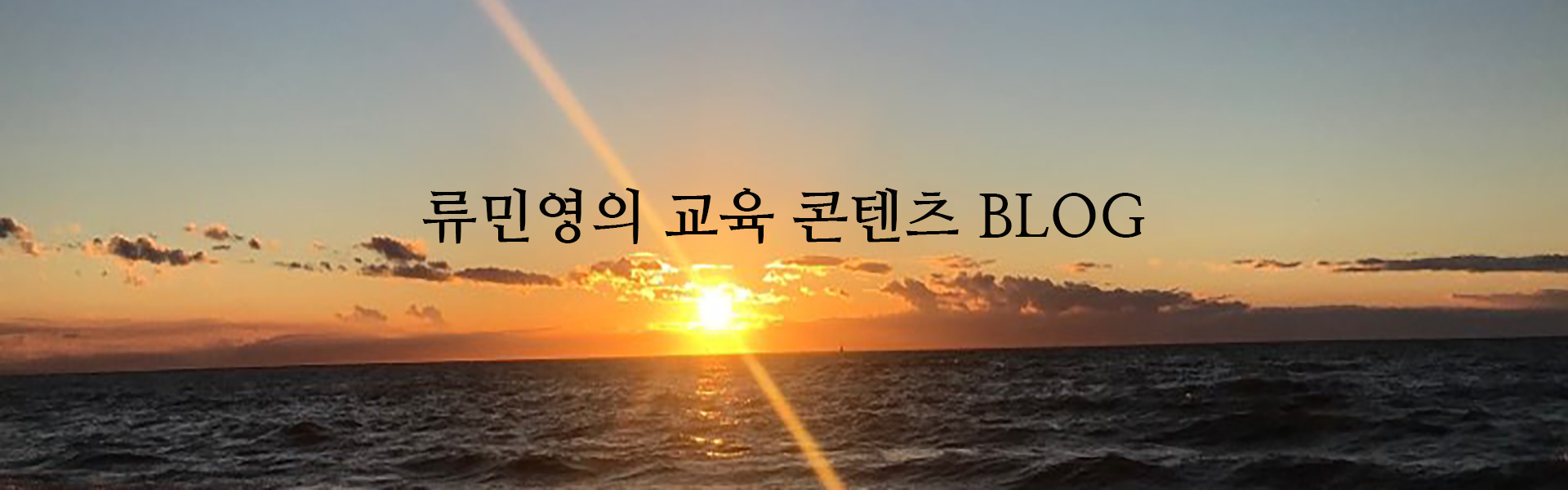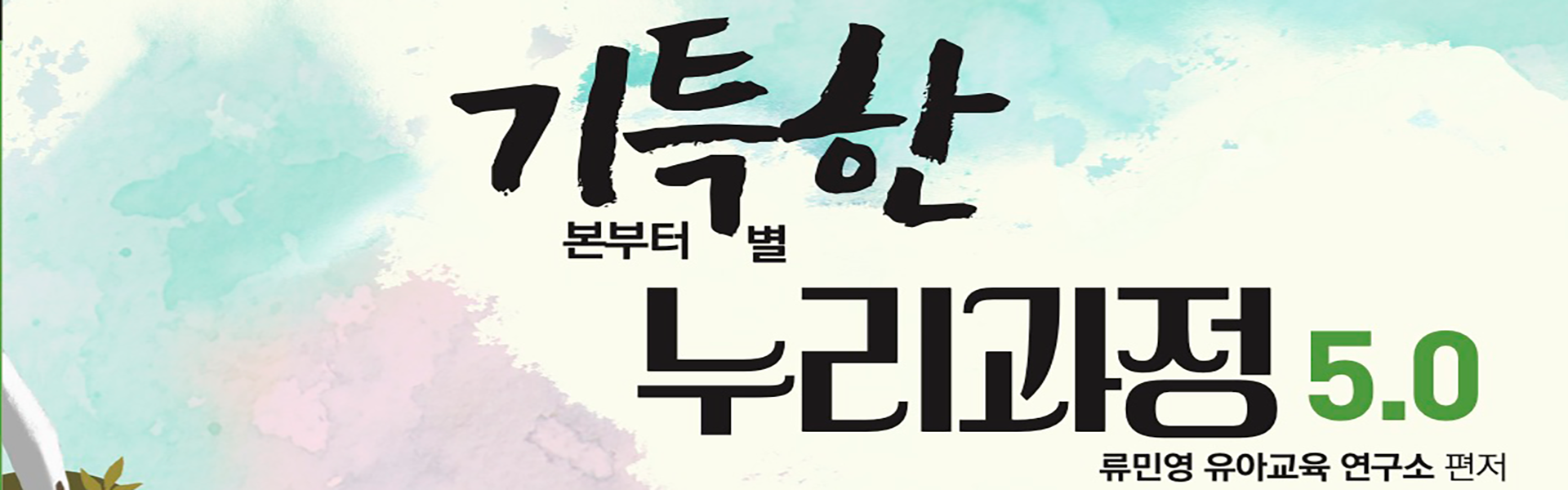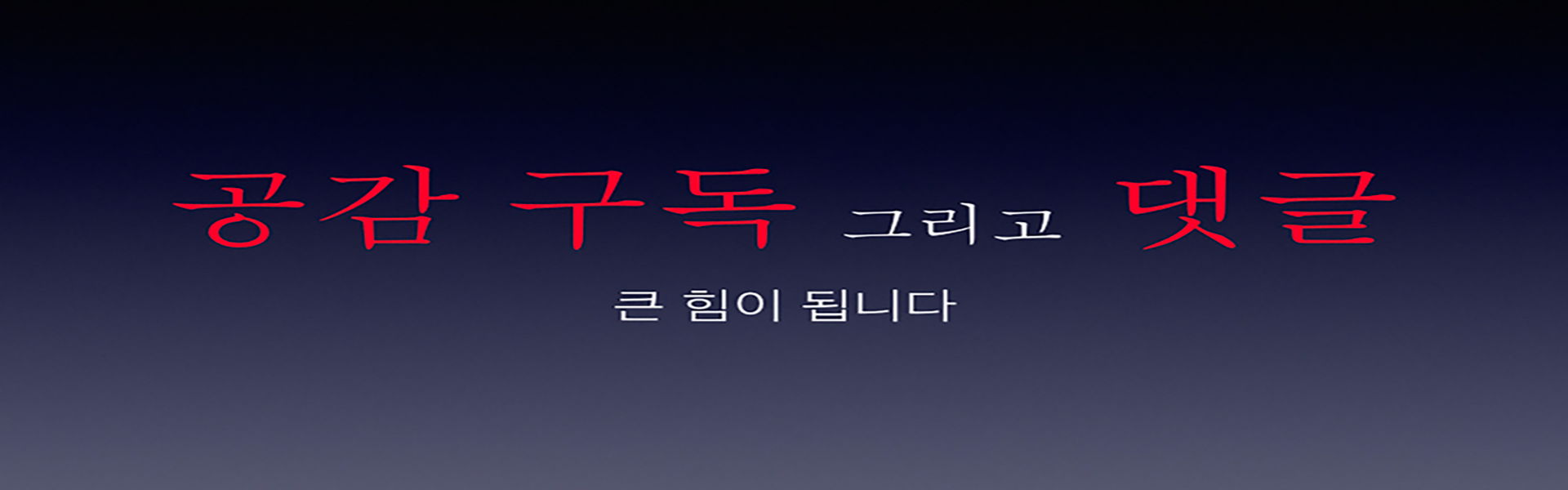1. 서양의 근대적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근대사회적 구조와 체제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사상적 경향
2.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은 1950년대의 초기에 역사학자인 토인비(A. Toynbee)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철학, 예술, 과학, 문화, 교육, 사회적 계획 등의 부문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3. 토인비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초근대적 시대에 임하면 다양성, 다원성, 무정부상태, 비합리성, 불확정성 등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4.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이나 언어, 예술,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근거, 즉 궁극적 법칙이나 논리, 또는 구조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계몽사상적 이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거역하고 보편적 이론이나 사상의 거대한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5.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사상적 체제나 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지식인들 혹은 문화인들의 취향도 아니다.
6. 그것은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징적으로 절대주의적 사고나 신념의 붕괴, 권위주의적 제도나 행동에의 저항, 전체주의적 체제나 지배의 거부를 의미한다.
7.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지식, 가치, 그리고 제도는 인간경험의 우연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만큼의 상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8. 이러한 경향으로 인한 가치체계의 붕괴는 허무주의를 발생시키고 이기주의와 아노미 현상을 초래케 한다는 우려도 있다.
9.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철학에서 선험적 판단의 권위를 의미하는 이성을 신봉하고 진리와 합리성의 절대적 기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근대적 사고에 대한 도전의 형태로 나타난 움직임이다.
10. 그것은 진리와 합리성은 선험적-절대적 사유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며, 필연적이고 항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며,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관심과 목표와 삶의 형식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경향의 사고이다.
11. 푸꼬(M. Foucault), 리오따르(J. Lyotard), 쿤(T. Kuhn), 파이어아벤트(P. Feyerabend), 가다머(H. Gadamer), 맥킨타이어(A. Maclntyre), 로티(R. Rorty) 등의 여러 학파적 노선의 사람들이 데카르트(R. Descartes), 칸트(I. Kant) 등의 계몽사상가들에 의해서 주장된 이성의 개념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12. 이러한 경향의 사고는 전통적 철학의 과제, 즉 궁극적 실재(實在)에 대한 선험적 확실성, 가치판단의 절대적 기준, 모든 지식에 공통된 인식론적 기반 등의 과제는 허황된 과제라고 본다.
13. 합리성은 맹목성을 지닌 것으로 가정되는 전통, 편견, 권위 등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이성 즉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적 개념의 이성이 지닌 속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편견 혹은 선입견(전이해)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해 혹은 해석의 특징이거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적 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4. 그러므로 진리는 필연적인 것일 수가 없으며 공통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도 없다.